윤창효 칼럼_나는 산으로 출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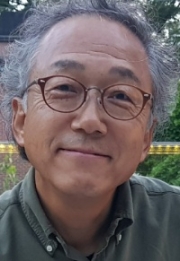
[광교신문 칼럼=윤창효] 산 마늘, 명이 나물을 시험 재배 한답시고 5년산 모종 1,000주를 지난 늦가을에 심어놓고 겨우내 가보질 못 했다. 겨울에 산촌은 춥고 가봐야 할 일이 별로 없다. 서울에서 주로 생활했다. 춥기도 하고 겨우내 눈이 쌓여있기도 했기 때문이다. 귀 산촌 준비 3년차인 지금은 혹한의 산촌도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안다. 추위의 맛도 있고 추위와 부대끼는 맛이 있는 것이다. 귀 산촌 준비 1년 차에는 무엇을 알겠나. 그저 아파트 단지 속에 있어야 하고, 지하 주차장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빌딩에서 빌딩으로, 겨울에는 운동도 실내에서 걷고 밀고 당기기를 주로 하면서 산다. 겨울에 서울 생활이 대부분 이랬다.
이듬해 2월이 되어 서야 산촌으로 갔다. 식재해 둔 산 마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산을 올라갔다. “ 말라 죽지는 않았을까? 얼어 죽지는 않았을까?” 산 마늘은 추위를 좋아하고 더위는 싫어한다. 왕성한 활동을 하는 이른 봄에도 반그늘을 좋아한다. 6월 정도에 날씨가 서서히 더워지기 시작 하면 잎이 비실비실 해지고 뿌리 쪽으로 영양분을 보내기 시작한다. 그 때쯤이면 벌써 동면을 준비하는 것이다. 겨울에는 눈이 오면 매우 좋다. 수분도 충분하고 이불 역할을 톡톡히 한다. 올겨울처럼 눈이 충분히 오지 않는 겨울은 산 마늘이 혹한을 견뎌내기 힘들다
사실 얘들이 잘 살아있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잊어 버리고 있었다. 서울에서 하는 생활이 그렇게 만든다. 2월말 새벽, 혼자 잿빛 숲 속을 올라가는데 저기 멀리 초록색의 어린잎이 삐죽 삐죽하고 나와있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다. 내가 시험 삼아 심어놓고 겨우내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팽개치다시피 한 산 마늘 이 아닌가. 그런데 거의 1000포기가 다 살아 있는 듯했다. 한창 추운 겨울 해발 700미터 산중의 기온은 기본이 영하 10도다. 아무리 5년 정도 다른 지역에서 살다 왔지만, 이사와 갓 자리를 잡아가는 임산물 에게는 혹독하다.
갑자기 뺨 위로 무엇인가 주르륵 흘렀다. 눈물이었다. 예고 없이 순간적으로 한줄기 굵게 흘렀다. 닦을 것도 없는 눈물이다. 그 다음은 뭔가가 가슴을 타고 아래로 내려 갔다. 고요한 아침 잿빛 숲 속에서 혼자 왜 이러는 걸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명을 키워준 자연에 감동해서 였을까. 부대끼며 살아온 지난 세월 때문 이 였을까.
동물이 밟고 지나갔는지 비스듬히 누워 있는 놈도 있고, 튀어 나와 뿌리만 지면에 살짝 걸쳤는데도 살아남은 놈도 있다. 대단한 생명력이다. 울릉도 사람들의 명을 이어 줬을 만한 과연 ‘명이 나물’ 이다. 올 가을에는 산에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여 제대로 수량을 심어 봐야겠다.

필자는 서울에서 정보기술(IT) 업계에 30년을 종사 하다 현재 경남 거창을 오가며 임야를 가꾸고 임산물을 재배 하고 있다.
위 칼럼은 신문사의 논지와 견해에 있어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